| [현장의 시각]일본 고양이와 영국신사의 미소 | ||||||||||||
| ||||||||||||
얼마 전 다녀온 일본에서 나는 쉽게 잊혀질 것 같지 않은 잔상을 갖고 돌아왔다. 주인공은 바로 복고양이 인형들이다. 크기나 색상은 제각각인데 한 손을 머리높이만큼 들어서 앙증맞게 손짓을 하는 포즈는 하나같이 똑같았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인형이었는데, 고양이가 왜 그렇게 손을 흔들게 댔는지는 그 곳에 가서야 알았다. 일본 히코네시(市)의 설화 속 이야기인즉, 에도시대 한 번주(藩主)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큰 나무 아래에서 잠시 비를 피할 때였다. 흰 고양이가 나타나 예의 그 손짓을 해 보이자 번주는 자신을 따라오라는 뜻인 줄 알고 걸어나와 나무를 저만치 벗어났다. 순간 벼락이 내리쳐서 나무는 순식간에 불에 탔고, 이후 고양이는 복을 상징하는 영물이 되어 그 지역을 상징하는 마스코트가 됐다. 관광지는 물론 공공시설물이나 골목길 어귀 등 눈길, 발길 닿는 곳 어느 곳에서나 복고양이의 나른한 미소와 마주쳤다. 오른손은 돈을, 왼손은 인복을 부르는 것으로 해석됐고 검은색, 붉은색, 황금색 등의 색상에 따라 기원의 의미도 다양해졌다. 요즘에는 양손을 다 흔드는 고양이가 등장했다니, 제 얼굴에 손을 대고 부벼대는 고양이 버릇을 이처럼 수만 갈래 이야기로 엮어내어 관광효과로 이끄는 그네들의 아이디어에 경외감마저 들 지경이었다. 수년전 선진문화도시 탐방차 다녀왔던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영국 리버풀시(市)도 내 여행기의 단골메뉴다. 곱씹을수록 기분좋은 에피소드 때문이다. 이국적인 경관이나 박물관은 매력적이긴 했으나 사실 기대치에는 모자랐다. 그보다는 사람들의 표정과 미소가 깊은 울림처럼 가슴에 남아있다. 조직이나 기구가 본청 내에 모여있는 울산과 달리 프랑크푸르트 문화국은 마인강 너머 수백년 된 고건물에 입주해 있었다. 초행길이라 한번에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정성이 가득 담긴 그들의 접대는 불편했던 과정을 눈녹듯 사라지게 만들었다. 건물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을 인터뷰 장소로 꾸며놓고 먼 길을 돌아 온 기자들에게 미리 덥혀 둔 차와 간식을 일일이 대접했다. 프랑크푸르트를 이야기할 때마다 고풍스런 실내와 설치작품은 물론 밀크티의 단맛이 혀끝에서 맴도는 듯 하다. 리버풀에서의 첫 일정도 뚝 떨어진 기온과 비바람 때문에 잠시 엉망이 되었지만, 그 곳 국제홍보국장의 위트가 분위기를 한결 부드럽게 만들었다. 인터뷰 중 사무실 창으로 햇볕이 드리워지자 그는 ‘어두운 도시에 햇살을 몰고 와 주어 고맙다’며 환하게 웃었다. 대단한 친절은 아니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만난 배려와 친절은 오히려 여운이 더 오래 간다. 만남의 목적이나 자리에 따라서는 한 도시의 이미지마저 좌우할 수 있음을 몸소 체험했다. 울산시는 요즘 관광도시 울산을 위해 잰걸음을 하는 중이다. 산업관광 거점도시로 비상하고자 기존 현장견학에 놀이와 체험을 접목하고 (가칭)대한민국 산업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때맞춰 울산발전연구원 또한 ‘울산 체류형 관광전략 수립연구’로 먹고, 자고, 즐기는 새로운 관광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어제오늘 울산시의 움직임이 참으로 반가운 한편 온갖 시설물 개관에 초점이 맞추어진 미래 전략 속에서 ‘스토리’와 ‘감동’의 콘텐츠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눈여겨 보게 됐다. 거대한 시설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나 평범하여 간과하는 우리의 이야기와 삶 속에서 관광객들은 유효기간이 없는 추억거리를 찾아낸다. 울산을 대표하는 마스코트 하나가, 관광도시에 어울리는 시민의식이 관광객이 곱씹게 될 감동의 무게를 결정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히코네, 프랑크, 리버풀 처럼 우리도 모르는 새 지구촌 어느 구석에서 울산이 끊임없이 회자될 날을 기대한다. 홍영진 문화생활부 차장 | ||||||||||||
> 알림마당
> 언론이 본 연구원
언론이 본 연구원
| 제목 | [현장의 시각]일본 고양이와 영국신사의 미소 | ||
| 언론사 | 경상일보 | 조회수 | 4363 |
| 작성일 | 2012-02-06 | 게재일자 | 2012-02-06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8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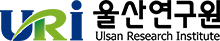





 thinpizza@ksilbo.co.kr
thinpiz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