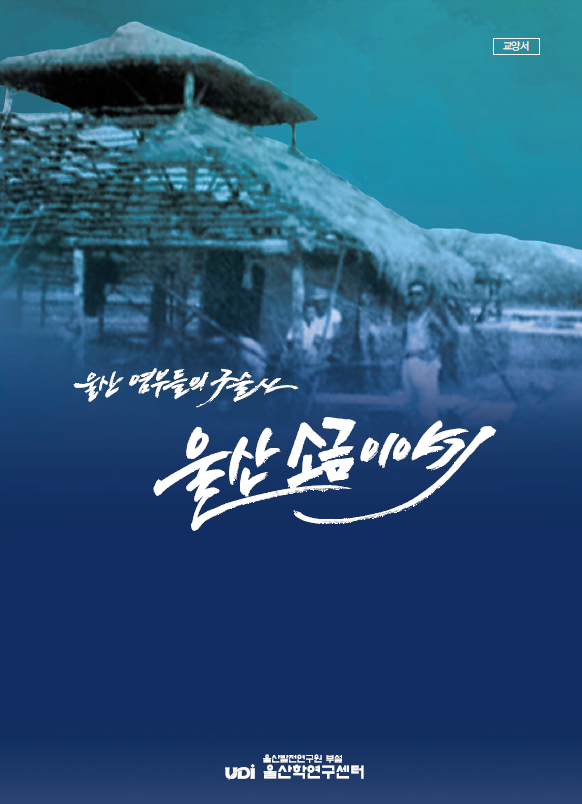조선시대 경상도 속담에 ‘영남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좌도는 울산이요, 우도는 김해이다’라는 말이 전해온다. 이 두 지역은 인간이 거주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지역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다. 두 지역의 지형을 유심히 살펴보면 육지가 돌출된 해안선에는 천혜의 만(灣)이 형성되어 있어 무풍지대에 가깝고, 강(江) 하구 삼각주에서는 질 좋은 전통소금이 생산되었다.
한반도 동남쪽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울산을 먹여 살렸던 것은 소금과 철이었다. 지금은 비록 쓰레기 보다 더 값싼 물건이 되고 말았지만 소금은 고대 울산산업의 근간이었다. 제가 울산 소금을 글로 남겨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하게 산업화된 울산은 철두철미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개발정책의 산물이다. 울산 염전은 산업화의 물결에 점차 밀려나다가 1965년대 울산공업단지에 매립되면서 그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염전이 있던 곳에 공단이 조성되었듯이, 공단이 사라진 염전을 상상해 본다.
그 지역의 소금을 제대로 알려면 그 지역의 역사, 정치, 지리, 환경, 토목, 향토사 등을 다양하게 살펴야 한다. 돌 하나, 조개껍질 하나하나가 유구한 세월에 쌓이고 쌓여 소금 알갱이를 일구어 내는 것이니 소금은 역사적인 산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아쉽게도 울산에는 지난 1,500년 동안 그들을 먹여 살렸던 소금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
이 책의 주인공은 울산 염부들이다. ‘울산 소금은 이래 굽는 기라’했던 마채염전 차동근씨의 넉살 좋은 울산 사투리는 구수했다. 이 시대 마지막 염전 어른인 오대염전 송의수씨, 깐깐한 소금 이야기꾼 하개염전 유윤선씨, 싱거운 염전 반장 김영옥씨, 울산 염전기록부를 꼼꼼히 작성한 돋질 조개섬염전 정해수씨도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이다. 그리고 울산 소금거상 김규한의 후손인 김진규와 김인자 씨, 염전에 땔감을 공급했던 나무장수 윤원찬 씨, 특히 최고령 생존자인 명촌염전 염부 박관수(95세)씨의 임종 인터뷰는 극적이었다.
이 분들의 울산 소금 이야기를 구술사로 옮겨 적었다. 가장 낮은 데에서 일어나는 진실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에 가급적 염부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애를 썼다. 구술의 가치는 기록 문화성, 즉 실제로 있었던 사실의 기록에 근거한 문학성에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