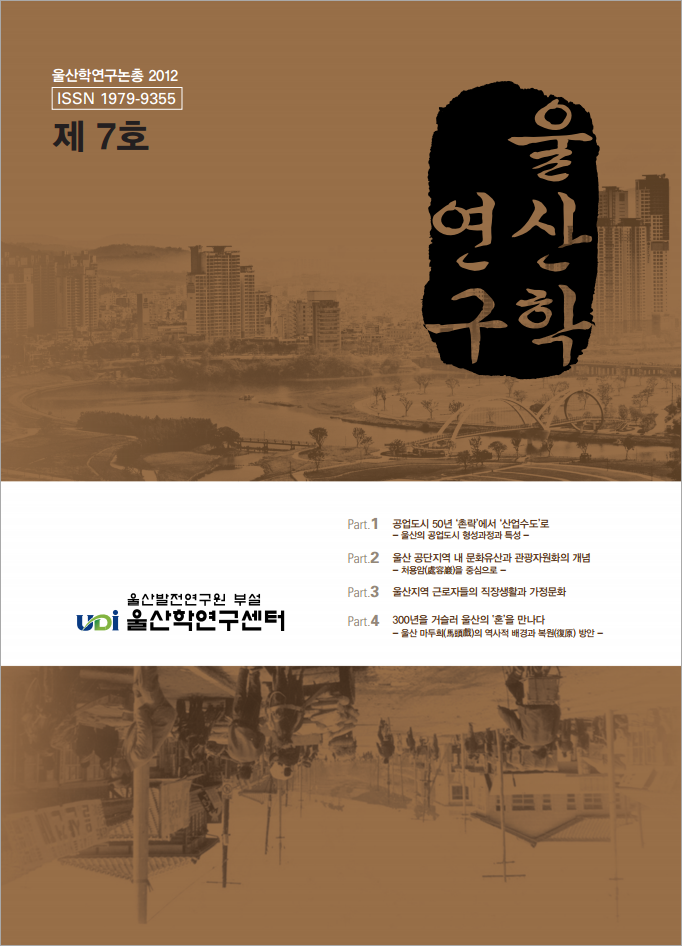마두희(馬頭戲)는 여느 지역의 줄다리기와는 생성된 바탕이 다르다. 울산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함축된 놀이형식이 바로 마두희이다. 마두희에는 가식이 없다. 웅장하면서도 기개의 고을 정서가 베어, 각종 읍지의 표현대로 상무예(尙武藝) 하고 타고난 성품이 굳세어 문화를 일으키고 교화를 쉽게 한다는 기록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것은 놀이라는 행위 자체의 연희 표출이지만 내면에는 울산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정신세계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 마두희는 웅대한 동대산의 숭앙에서 비롯된 공동체의식이다. 자고 깨면 쳐다보는 동대산은 울산 사람들에 있어서, 산이면서 모태적(母胎的) 위안처이기도 하다. 동대산이 말머리 모양을 하면서 고을을 등지려 하니, 소박한 고을 사람들은 우려가 아닐 수 없었다. 이를 대처하기위한 방편으로 마두희를 연희 하게 되었으니 마두희야말로 고을민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놀이의 표출적 기능이 일상의 문화적 요소를 재창조하는 측면이 있다면 마두희는 고을의 구성원인 민중을 집단화 시켜 주고 응집력을 제공 했다. 고을민은 놀이가 갖는 이러한 표현성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희열과 자아의 실현을 획득하면서 집단적 공감대도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신명이 고조되고 신명은 억압된 육체와 정신을 다듬게 했다. 마두희를 통해 현실을 되새기고 고을 운명을 고르게 하려 의례적 요소도 가미시켰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신적(娛神的) 기능이 가미되고 유희적 표현이 짙어지면서 세시풍속화 되었다. 의식적 놀이가 세시적 행사로 거듭날 때면 공동체의 결집은 더욱 공고해 진다. 울산 사람들은 마두희라는 기능을 통해 일상의 갈등을 극복하고 친목을 다지며 일의 능률도 발휘했다.
생산성 증대로 사회의 풍요를 누리면서 문화적 요소는 더욱 다져 나갔다. 마두희는 이러한 과정을 거듭하면서 기풍(祈豊)과 점풍(占豊)사상이 고착화되어 놀이 이상의 의미를 지닌 성스러운 의례형식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정신문화가 일제의 강압으로 소멸 되었으니 당시로서는 고을민의 정체성을 박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 였을 것이다. 그 모멸감도 시간이 흐르면서 희석되어 마두희는 우리 곁에서 멀어져 있다. 마두희를 복원하자는 것은 유희적 행위를 재연(再演) 하자는 것만이 아니다. 동대산에서 유래한 정신적 바탕을 새기며 우리 선인들의 유희적 표출 속에 잠자고 있는 의례 정신을 되새기자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시대의 대동놀이를 재창조할 수도 있다. 마두희를, 줄다리기라는 단순한 놀이적 개념에 부가하여 선조의 얼을 새기고 정신문화를 계승하는 공동체 의미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