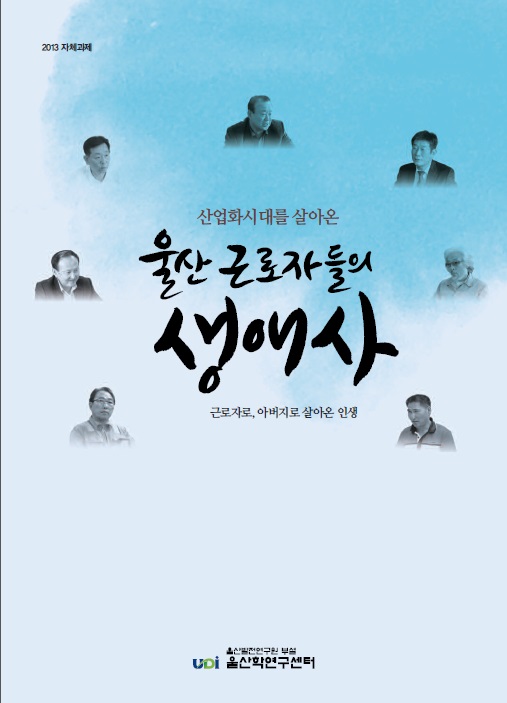울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산업도시로 성장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그 바탕에는 현장에서 땀흘려 일해온 우리 아버지들이 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기 시작하면서 생산현장에 뛰어든 아버지들은 이미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의 생애사에는 한국 산업화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 있다. 우리 아버지들은 어디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학창시절은 어떠했으며, 울산에 오기 전에는 어떤 경험을 하였을까? 울산으로 온 뒤 어떤 경로를 통해 자신의 노동 생활에서 대부분을 보낸 직장에 취업하였고,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떤 경험을 하였을까? 퇴근 후 어떤 여가 활동을 하였으며, 가족 생활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이후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들의 생애사를 그들의 목소리로 복원한다. 산업화세대로서 한국 산업화의 또 다른 축으로서 그들이 기여한 역할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의미를 부여하며 새로은 삶을 계획해야하는 단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들이 일을 시작한 1970년대는 작업체계나 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작업환경 역시 열악한 곳이 많았다.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생활했다. 직장 생활은 그런 것이었기에 후회 없는 것이기도 하다. 또는 사람대접 받는 작업장을 만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다.
다양한 작업장에서 다양한 노동경험을 한 일곱 명의 우리 아버지들의 생애사가 여기 있다. 농촌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쳤다. 이들은 울산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다른 지역 출신이기도 하다. 이미 다른 곳에서 일한 경험을 가진 경우도 있고, 첫 직장을 울산에서 구한 경우도 있다. 울산에 대규모 공장이 많은 까닭에 이들은 상대적으로 큰 기업에서 노동일을 시작하였다. 이들이 노동일을 시작한 때는 울산에 막 공장이 들어서고,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이다. 기업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 그들이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신발끈을 벗지 못한 채 출퇴근을 하기도 했고, 산업재해를 목격하기도 했으며, 노동조합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생산현장에서 청춘을 보내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하는 기로에 선 우리 아버지들을 응원하며, 그들이 풀어내는 생애사에 귀를 기울여보자. 스스로 자신의 역사를 복원해내는 '자기 역사 쓰기'는 시작점에 있으며, 이 책에서는 다양한 작업현장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일곱 명의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들의 이야기가 이후 더욱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구술에 참여한 주인공들은 짧게는 3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 이상에 걸쳐 자신의 생애사를 들려주었다.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노동생애사를 생생하게 복원하였다. 말하기와 쓰기의 표현방식은 다르지만 이 책에서는 구술자들의 생새하게 살아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그들의 말 그대로를 옮기려 노력하였고, 고향의 말을 그대로 살려서 표기하였다. 표준어 표기에 익숙한 우리에게 잘못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역사의 주인공인 구술자들이 스스로 풀어가는 노동 생애사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