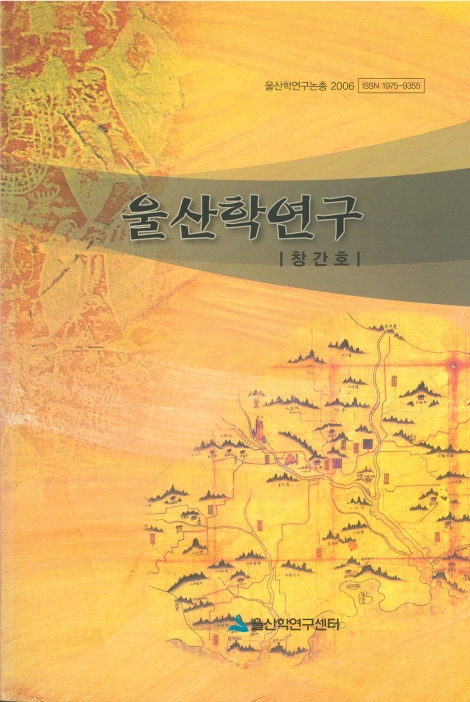연구자 : 원영미(울산대 외래강사)
1987년‘노동자대투쟁’기에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노동운동을 장기간 벌여나갔다. 대투쟁이 장기간 폭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 사이에 동질감과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세계에서 누적된 불만과 분노가 유대감 형성의 기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싹과 경쟁적인 분위기가 공존하는 노동세계에서 유대감이 형성되기는 어려웠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울산에서 가까운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이 많았다. 국민전체의 학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연령별 구성을 보면 20세 이상의 청장년층 남성노동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32세 이하의 청년층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학력수준이 높은 년 노동자들은 이후 급진적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농촌출신의 1세대 노동자로서, 조직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작업장과 인접한 지역에 형성되어 있던 노동자 집단 주거지는 노동세계의 경험을 생활세계로 확장시켜 놓았다. 반공개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집단주거지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사이에 계급적 처지가 공유되는 공간이었다. 노동운동 과정에서 확인되는 노동자가족과 이웃의 파업 지원은 그들 사이에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장시간 노동으로 여가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자들에게 음주는 일상적인 여가활동이었다. 음주는 노동의 피로를 풀고 노동력을 재충전하기 위한 피로회복제이자 영양보충제였다. 일상적인 음주로 만취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되기도 했지만, 노동자에게 음주는 고된 노동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 교류와 유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였다. 퇴근길
에 동료와 함께, 거칠고 위험한 작업장 노동에서 쌓인 피곤을 음주로 풀고, 노동세계에서 쌓인 불만을 토로하며 작업장의 경험을 나누었다. 장시간의 고된 노동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차단되어 있는 노동자들에게 술자리 대화는 정보를 교환하는 유익한 자리였다. 술자리는 노동자들이 서로의 동질감을 확인하는 장이었던 것이다.
노동자들은 집단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주거공동체에서 음주를 매개로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노동세계의 경험을 공유하고 동질적인 삶의 조건을 확인하는 가운데 동질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형성된 동질감과 유대감이 군사정권의 억압적 통제가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민주화운동을 경험하면서‘노동자대투쟁’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노동자의 생활세계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소 조심스럽다. 더 많은 구술과 자료 발굴 작업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